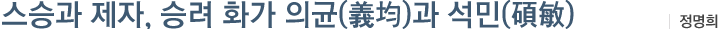조선시대의 뛰어난 화가 하면 어떤 이름이 떠오르나요? 선비 화가 공재 윤두서(恭齋 尹斗緖, 1668~1715),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畫)의 겸재 정선(謙齋 鄭敾, 1676~1759), 풍속화의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 처럼 좋아하는 그림의 장르나 인상 깊었던 전시에서 만났던 몇몇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려 화가의 경우는 어떤가요. 승려이면서 화가였던 이들의 존재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나 작품이 있으신가요.

의균, <아미타불회도>, 1703년, 비단에 색, 307.5×244cm, 덕수2680
조선시대는 이른바 승려 장인, 승장(僧匠)의 시대입니다. 사찰(寺刹) 전각의 축소와 중건을 비롯하여 내부에 봉안되는 불상, 불화, 범종(梵鍾)과 같은 불교미술품이 승장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사찰은 조선시대 미술의 제작지이자 소비처로서 중요한 공간이었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일생 동안 불보살을 그림으로써 부처의 가르침에 이르는 길을 택한 이들을 화승(畫僧)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큰 사찰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인근 지역 불사(佛事)에 초빙되어 불화를 제작했습니다.
먼 거리, 어려운 불사를 마다하지 않고 작업하며 자신의 고유한 방식을 제자에게 전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의 유파(流波)를 이루기도 하고 다른 유파와 협동 작업도 진행하면서 지역별로 양식적인 차이가 뚜렷한 조선 불화의 조형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찰에 전하는 사적기(事蹟記), 불화에 남겨진 기록인 화기(畫記), 불상의 복장(腹藏)에서 나온 기록으로 밝혀진 조선시대 불화를 전문적으로 그린 화승의 이름은 2,400명이 넘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승려 화가 의균(義均)은 동화사(桐華寺)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팔공산 화파(畫派)의 기틀을 다진 화승이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의균의 불화는 다섯 점으로 모두 쟁쟁한 실력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승이 그러하듯 그의 생몰년과 행적에 관한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불화와 화기를 통해 활동과 영향력을 추측해 볼 뿐입니다.

<아미타불회도> 세부
의균이 1703년 제작한 〈아미타불회도(阿彌陀佛繪圖)〉는 그의 불화 중 대표적인 작품이자 불교회화실의 가장 선배격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불교의 정토(淨土) 중에서도 사람들이 사후 가장 태어나고자 꿈꾸었던 곳이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입니다. 배경이 생략된 공간에는 아미타불의 설법회에 참석한 여섯 보살이 둥글게 원을 그리듯 서 있습니다. 각 보살을 구별할 수 있는 도상(圖像)과 특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관음과 대세지보살, 문수와 보현보살, 금강장과 제장애보살로 생각됩니다. 아미타불의 날렵한 신체 비례와 둥근 얼굴, 중앙 계주(髻珠)를 나타내는 대신 높은 육계(肉髻)와 뾰족하게 솟은 정상 계주를 표현한 것은 앞선 시기의 불화에서 사용되던 고식(古式)의 양식을 따른 것입니다.
아미타불과 여섯 보살이 자리한 공간 뒤로는 분홍, 초록, 노란색의 채색 구름이 피어올라 이곳이 상서로운 세계임을 상징합니다. 어느 것 하나 시선을 어지럽히지 않는 간결한 구성에, 그림을 보는 사람의 시선은 더욱 더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에게로 집중됩니다. 의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공간, 이상적인 존재는 영원한 순간을 포착한 듯 정적이면서 차분합니다. 그가 남긴 불화에서 화승 의균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의균의 제자 중 대표적인 화승이 석민(碩敏)입니다. 석민이 우두머리 화사로 제작한 불화가 1725년 조성된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입니다. 지장시왕도는 불교의 내세관을 그린 그림으로, 명부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성불하지 않고 영혼을 구제하겠다고 선언한 지장보살과 여섯 보살, 지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 사후 심판을 담당하는 지옥의 시왕(十王) 등이 도해되어 있습니다. 석민은 굉원(宏遠), 치흠(致欽), 풍연(豊衍), 추연(秋演) 등 다섯 명의 화승과 함께 이 불화를 그렸습니다.

석민 등, <지장시왕도> , 조선 1725년, 비단 위에 채색, 224.2×179.4cm, 덕수1031
의균은 제자가 그린 불화에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석민의 〈지장시왕도〉에서 의균의 이름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가 화승이 아닌 대중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공양주(供養主)’라는 소임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의균은 화승으로서는 은퇴한 이후에도 제자가 주도하여 그린 불사에서 공양주, 화주(化主), 시주(施主)의 소임으로 참여했습니다. 불사의 다른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 줌과 동시에 제자들의 작업을 감독, 감수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의균 제자들의 불화는 화면의 구성과 존상의 배치, 불보살의 표현과 담채색 계열의 선호 등에서 스승 의균의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화승의 불화에서 확인되는 의균의 특징은 제자를 양성하고 이들의 불화 제작을 감독하는 의균의 영향력을 보여 줍니다.
석민이 제작한 지장사 지장보살도의 밑그림은 1728년 동화사 삼장보살도, 지장보살도로 계승됩니다. 밑그림인 초본의 도상을 그대로 사용하여 세부적인 부분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당시 석민은 화승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화기에 ‘본사(本寺) 시주자(施主者)’로 기재되어 불사의 재정적 지원을 맡는 시주자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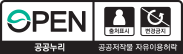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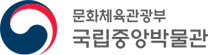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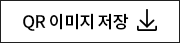
 X
X  페이스북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