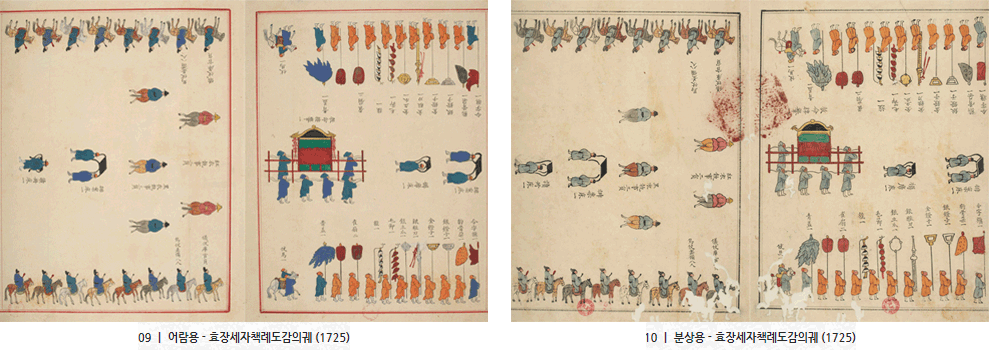홈 > 의궤이야기 > 외규장각 의궤의 특징 > 왕이 본 책, 어람용 의궤
왕이 본 책, 어람용 의궤
외규장각 의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대부분 국왕의 열람을 위해 제작한 어람용(御覽用) 의궤라는 점이다. 외규장각 의궤 297책 중 어람용은 의궤 289책, 등록 1책으로 총 290책에 이르고, 분상용은 의궤 5책과 형지안 2책 등 7책에 불과하다.
조선왕조의 주요 행사 기록인 의궤(儀軌)는 조선시대의 주요 국가 기록물이 그러하듯이 동일한 내용을 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용과 나누어 보관하기 위한 분상용(分上用)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01 ㅣ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 (1686)
어람용 의궤는 왕의 열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하였기 때문에 분상용에 비해 종이와 표지, 안료의 재질, 장정 방법, 서체와 필사, 그림의 수준 등 그 형태와 재질, 제작 기법 등이 매우 뛰어나다. 즉, 어람용으로 제작된 외규장각 의궤는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도서 수준과 예술적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매우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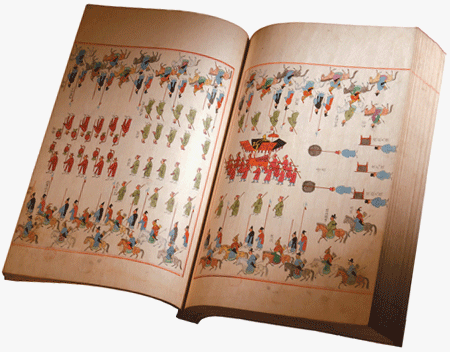
02 ㅣ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하 (1759)
그렇다면, 어람용 의궤는 분상용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의궤 제작의 원칙을 정리한 「의궤사목(儀軌事目)」에 기록된 의궤의 재료와 제작 방법을 통해 어람용과 분상용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의궤 제작의 원칙을 정리한 「의궤사목(儀軌事目)」에 기록된 의궤의 재료와 제작 방법을 통해 어람용과 분상용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어람용과 분상용의 재료 비교(『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 구분 | 어람용 | 분상용 |
|---|---|---|
| 표지(衣) | 초록경광주(草綠輕光紬) : 2척 2촌 | 홍정포(紅正布) : 2척 2촌 |
| 제목(題目) | 백경광주(白輕光紬) : 길이 7촌, 너비 1촌 | |
| 홍협(紅挾) | 홍경광주(紅輕光紬) : 길이 7촌, 너비 5푼 | |
| 배접(褙接) | 백휴지(白休紙) : 6장 | |
| 면지(面紙) | 초주지(草注紙) : 2장 | 저주지(楮注紙) : 2장 |
| 후배(後背) | 옥색지(玉色紙) : 1장 | 옥색지(玉色紙) : 1장 |
| 책지(冊紙) | 초주지(草注紙) | 저주지(楮注紙) |
| 변철(邊鐵) | 두석(豆錫: 놋쇠) | 정철(正鐵) |
| 기타 | 국화동(菊花童), 원환(圓環), 박철(朴鐵) | 원환(圓環), 박철(朴鐵) |
| 글씨 | 황필(黃筆), 진묵(眞墨) | 황필(黃筆), 진묵(眞墨) |
| 인찰선 (印札線) | 화필(畵筆), 당주홍(唐朱紅) : 화원이 그림 | 상묵(常墨), 황밀(黃蜜), 마염(馬髥), 미추(尾箒), 자작판(自作板) 등 : 인쇄(목판) |
전체적인 제작 방법을 살펴보면, 어람용은 고급 종이인 초주지(草注紙)를 내지로 사용하여 각 장마다 왕의 상징인 붉은 색으로 테두리를 그은 후, 해서체로 정성껏 글씨를 쓰고 천연안료로 곱게 그림을 그렸다. 표지는 녹색의 고급 비단으로 싸고 무늬가 새겨진 놋쇠조각[邊鐵]을 대어 5개의 못으로 고정시킨 후 아래위로 둥근 국화무늬판을 대어 제본하였으며, 가운데 것에는 둥근 고리[圓環]를 달았다. 제목감은 흰 비단을 사용하고 그 가장자리로 가늘게 붉은 비단을 둘러 고급스럽게 제작하였다.
표지와 변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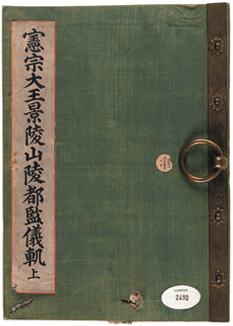
03 ㅣ 어람용 - 헌종경릉산릉도감의궤 상 (1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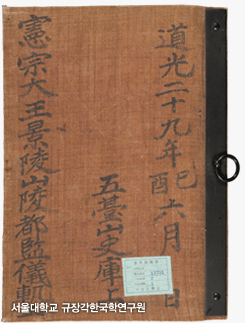
04 ㅣ 분상용 - 헌종경릉산릉도감의궤 (184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반면, 분상용은 내지로 저주지(楮注紙)를 사용하고 내지의 각 장에는 목판으로 찍어낸 검은 테두리를 둘러 글씨를 썼다. 내지의 각 면마다 소장처의 인장을 찍었다. 표지는 종이나 붉은 베로 싸서 실끈으로 제본하거나 무쇠조각으로 앞뒤를 대고 3개의 못을 박아 장정하였다. 제목은 표지 위에 직접 먹으로 썼는데, 대개 분상처도 함께 표기하였다. 분상용은 어람용에 비해 실무 관청에서 보관하고 참고하는 용도로서 실용성이 강조되었다.
지질(紙質)의 경우, 초주지를 사용한 어람용은 저주지를 사용한 분상용에 비해 두껍고 색이 좋으며 변색 또한 적게 이루어졌다. 서체에 있어서도 어람용은 매우 단정한 해서체로 쓰였으나 분상용은 일부 흘려쓴 부분도 있으며, 어람용의 경우 글자 간격을 충분히 두고 써 한결 시원스러운 느낌을 준다. 동일한 행사에 대해 어람용은 2책으로 분책한 반면 분상용은 1책으로 합본한 경우가 많으며, 분량은 어람용이 분상용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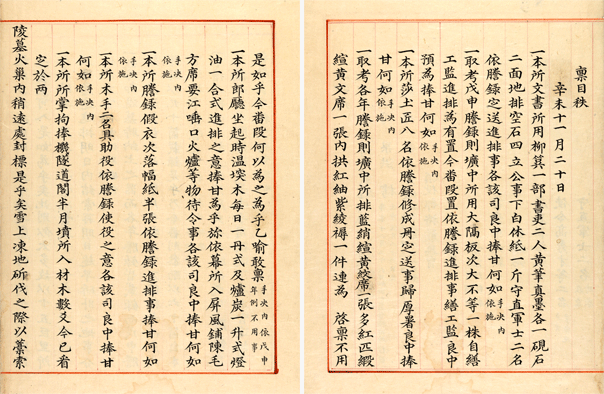
05 ㅣ 어람용 -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1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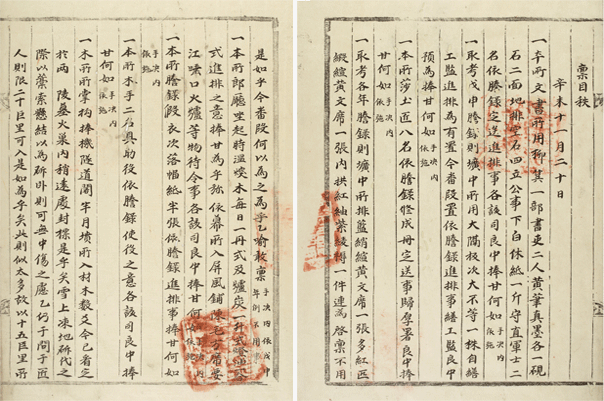
06 ㅣ 분상용 -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1751)
어람용과 분상용의 차이는 특히 도설(圖說)과 반차도(班次圖)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람용 의궤의 반차도는 행렬에 배치된 인물과 말, 각종 기물을 일일이 붓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였으며 행렬 좌우의 말과 사람들이 움직이는 듯한 동적인 느낌을 준다. 19세기 의궤 중 어람용에도 반차도에서 반복되는 인물 등은 도장처럼 찍은 후 채색한 사례가 나타기도 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채색과 필선이 섬세하며 안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분상용과 대조적으로 매우 선명한 색감을 보인다.
반면, 분상용 의궤의 반차도는 큰 변화 없이 인물과 사물을 배치하고 채색하였는데, 반복되는 인물은 대개 도장으로 찍은 후 채색하였다. 특히 말과 사람들이 정지한 듯한 일률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에서 어람용과 큰 차이가 있다. 분상용의 반차도는 채색이 안 된 부분도 많고 인물의 표현도 개략적인 선으로 그린 초본(初本)인 경우도 많다.
반면, 분상용 의궤의 반차도는 큰 변화 없이 인물과 사물을 배치하고 채색하였는데, 반복되는 인물은 대개 도장으로 찍은 후 채색하였다. 특히 말과 사람들이 정지한 듯한 일률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에서 어람용과 큰 차이가 있다. 분상용의 반차도는 채색이 안 된 부분도 많고 인물의 표현도 개략적인 선으로 그린 초본(初本)인 경우도 많다.
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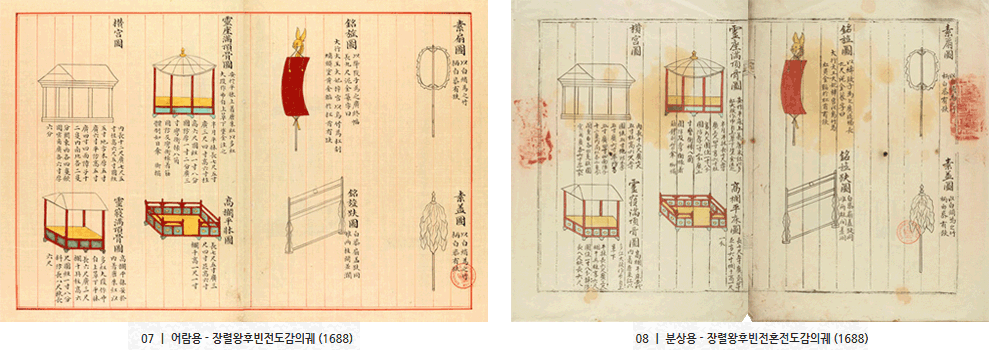
반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