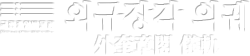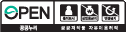홈 > 반차도열람>
전체>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 (상)
* 색인어를 클릭해 보세요
- 각답(脚踏)
- 견여(肩轝)
- 경기감사(京畿監司)
- 국장도감당상(國葬都監堂上)
- 국장도감삼방관원(國葬都監三房官員)
- 국장도감삼방관원(國葬都監三房官員)
- 국장도감일방관원(國葬都監一房官員)
- 국장도감일방관원(國葬都監一房官員)
- 궁녀이십(宮女二十)
- 귀유치(歸遊赤)
- 귀유치(歸遊赤)
- 금등이(金鐙二)
- 금등이(金鐙二)
- 금월부(金鉞斧)
- 금월부(金鉞斧)
- 금입과(金立瓜)
- 금입과(金立瓜)
- 금장도(金粧刀)
- 금장도(金粧刀)
- 금횡과(金橫瓜)
- 금횡과(金橫瓜)
- 낭청(郎廳)
- 낭청(郎廳)
- 내시(內侍)
- 내시(內侍)
- 내시(內侍)
- 내시삼(內侍三)
- 내의원(內醫院)
- 대여(大轝)
- 도청(都廳)
- 도청(都廳)
- 도총부낭청(都摠府郎廳)
- 도총부당상(都摠府堂上)
- 돈체사(頓遞使)
- 동반(東班)
- 마궤일(馬机一)
- 만장이십사(挽章二十四)
- 만장이십사(挽章二十四)
- 만장이십사(挽章二十四)
- 만장이십사(挽章二十四)
- 망촉충찬위일백인(望燭忠贊衛一百人)
- 망촉충찬위일백인(望燭忠贊衛一百人)
- 면복채여일(冕服彩轝一)
- 명정기(銘旌機)
- 명정내시경집(銘旌內侍擎執)
- 모절이(旄節二)
- 모절이(旄節二)
- 목기궤채여일(木器樻彩轝一)
- 목노비궤채여일(木奴婢樻彩轝一)
- 무인년가례시교명고명요여일(戊寅年嘉禮時敎命誥命腰轝一)
- 무인년가례시옥책옥보요여일(戊寅年嘉禮時玉冊玉寶腰轝一)
- 방상씨이(方相氏二)
- 방상씨이(方相氏二)
- 배왕대장(陪往大將)
- 백촉롱(白燭籠)
- 백촉롱(白燭籠)
- 백택기(白澤旗)
- 백택기(白澤旗)
- 병인년존숭시옥책옥보요여일(丙寅年尊崇時玉冊玉寶腰轝一)
- 병조낭청(兵曹郎廳)
- 병조당상(兵曹堂上)
- 병조정랑(兵曹正郞)
- 병진년존숭시옥책옥보요여일(丙辰年尊崇時玉冊玉寶腰轝一)
- 보삽(黼翣)
- 보삽(黼翣)
- 복완채여일(服玩彩轝一)
- 봉거군이백오십명(捧炬軍二百五十名)
- 봉거군이백오십명(捧炬軍二百五十名)
- 불삽(黻翣)
- 불삽(黻翣)
- 빈전도감당상(殯殿都監堂上)
- 사관(史官)
- 사기궤채여일(沙器樻彩轝一)
- 상서원관원(尙瑞院官員)
- 상의원(尙衣院)
- 서반(西班)
- 선공감관원(繕工監官員)
- 소궤채여일(筲樻彩轝一)
- 수릉관(守陵官)
- 승지(承旨)
- 시릉관(侍陵官)
- 시보요여일(諡寶腰轝一)
- 시책요여일(諡冊腰轝一)
- 신묘년존숭시옥책옥보요여일(辛卯年尊崇時玉冊玉寶腰轝一)
- 신축년존숭시옥책옥보요여일(辛丑年尊崇時玉冊玉寶腰轝一)
- 악기궤채여일(樂器樻彩轝一)
- 애책채여일(哀冊彩轝一)
- 예조정랑(禮曹正郞)
- 왕자(王子)
- 왕자(王子)
- 우보(羽葆)
- 우상군사(右廂軍士)
- 우상장(右廂將)
- 운검(雲劒)
- 운검(雲劒)
- 유의칭가자일(遺衣稱架子一)
- 은관자(銀灌子)
- 은교의(銀交倚)
- 은등이(銀鐙二)
- 은등이(銀鐙二)
- 은우(銀盂)
- 은월부(銀鉞斧)
- 은월부(銀鉞斧)
- 은입과(銀立瓜)
- 은입과(銀立瓜)
- 은장도(銀粧刀)
- 은장도(銀粧刀)
- 은횡과(銀橫瓜)
- 은횡과(銀橫瓜)
-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 자수안마사(紫繡鞍馬四)
- 작선삼(雀扇三)
- 작선삼(雀扇三)
- 장족아(長足兒)
- 장족아(長足兒)
- 전부고취(前部鼓吹)
- 전사대군(前射隊軍)
- 전사대장(前射隊將)
- 종사관(從事官)
- 종사관(從事官)
- 좌상군사(左廂軍士)
- 좌상장(左廂將)
- 주장내시(朱杖內侍)
- 주장내시(朱杖內侍)
- 주화단선사(朱畫團扇四)
- 주화단선사(朱畫團扇四)
- 죽산마일(竹散馬一)
- 죽산마일(竹散馬一)
- 죽안마이(竹鞍馬二)
- 죽안마이(竹鞍馬二)
- 집탁호군팔(執鐸護軍八)
- 집탁호군팔(執鐸護軍八)
- 청개(靑蓋)
- 청선이(靑扇二)
- 청수안마사(靑繡鞍馬四)
- 청촉롱(靑燭籠)
- 청촉롱(靑燭籠)
- 총호사(摠護使)
- 평교자일(平轎子一)
- 행장주거처칙변위좌장(行障駐車處則變爲坐障)
- 행장주거처칙변위좌장(行障駐車處則變爲坐障)
- 행장주여처칙변위좌장(行障駐轝處則變爲坐障)
- 행장주여처칙변위좌장(行障駐轝處則變爲坐障)
- 향정자(香亭子)
- 향정자(香亭子)
- 향좌아(香座兒)
- 향좌아(香座兒)
- 협상(挾床)
- 혼백거(魂帛車)
- 혼백교의(魂帛交倚)
- 혼백요여일(魂帛腰轝一)
- 홍개(紅蓋)
- 홍양산(紅陽繖)
- 홍촉롱(紅燭籠)
- 홍촉롱(紅燭籠)
- 화삽(畫翣)
- 화삽(畫翣)
- 화촉롱이십(火燭籠二十)
- 화촉롱이십(火燭籠二十)
- 후부고취(後部鼓吹)
- 후사대군(後射隊軍)
- 후사대장(後射隊將)

1688년(숙종 14) 8월~12월에 거행된 인조(仁祖)의 계비 장렬왕후 조씨(莊烈王后 趙氏, 1624~1688)의 국장 과정을 기록한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莊烈王后國葬都監儀軌)』상하 2책 중 상책에 수록된 반차도이다. 장렬왕후는 1688년 8월 26일 향년 65세로 창경궁 내반원(內班院)에서 승하하였다. 왕후의 빈전은 9월 1일 같은 궁 환경전에 차려졌고, 12월 15일 발인하여 16일 동구릉(東九陵) 경내에 안장되었다. 왕후의 우주는 같은 날 창경궁 문정전에 마련된 혼전에 모셔졌다.
이 반차도는 빈전에 모셔두었던 장렬왕후의 혼백함과 재궁을 받들고 산릉으로 향하는 발인 행렬의 반차를 그린 것이다. 행렬의 기본 구성은 앞서 있었던 인경왕후 김씨(仁敬王后 金氏)의 발인반차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15세에 인조의 계비가 되어 효종(孝宗)·현종(顯宗)·숙종(肅宗) 대를 거치면서 왕대비, 대왕대비로서 지내온 장렬왕후의 이력이 발인 행렬에 드러나 있다. 장렬왕후는 생전에 총 4회의 존호를 받았는데, 각각의 책·보를 요여에 봉안하여 길의장 행렬에 배치하였다. 순서는 네번째 병인년(1686, 회갑 기념으로 강인(康仁)이라는 존호를 받음) 존숭 시 받은 옥책·옥보 요여부터 세번째 병진년(1676, 현종 부묘 후 휘헌(徽獻)이라는 존호를 받음) 존숭, 두번째 신축년(1661, 효종 부묘 후 대왕대비로서 공신(恭愼)이라는 존호를 받음) 존숭, 첫번째 신묘년(1651, 인조 부묘 후 왕대비로서 자의(慈懿)라는 존호를 받음) 존숭, 그리고 1638(무인년) 가례 시의 책·보와 교명·고명 요여 순이다. 또한 인조의 두 아들인 숭선군(崇善君)과 낙선군(樂善君)이 대여 뒤 호종 행렬에 섰다.
현재 분상용 의궤 반차도는 전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이 반차도는 어람용 의궤에 수록된 유일본 반차도이다. 이 시기 어람용 의궤 반차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인물과 가마, 각종 기물을 유형화하여 일일이 그리고 세밀하게 채색하여 완성하였다. 각 상은 크기나 자세에서 편차가 없이 균일하여 매우 정연한 화면을 보여 준다. 또한 단면으로 묘사된 중앙 열의 가마류, ‘정(井)'자형 가마채 배치, 상하로 포개어 올린 가마꾼 포치에서 보듯 화면에 공간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봉거군과 의장수, 가마꾼들은 움직임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얼굴도 타원형으로 단순화해 버렸고 손은 소매 속에 넣은 것처럼 생략하였다. 채색에서는 길의장 행렬의 의장수와 가마꾼의 자색 옷, 군관과 흉의장 가마꾼의 백색 옷, 관원의 누런 색 참최복 색깔, 관원들의 청색 옷 등이 잘 구분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송희)